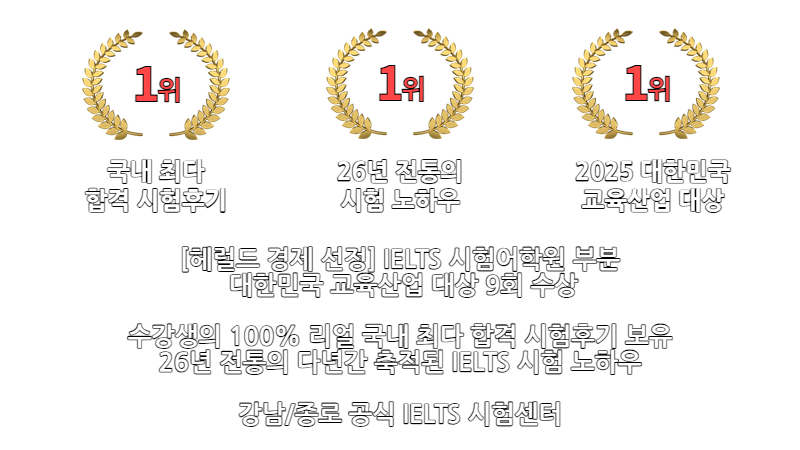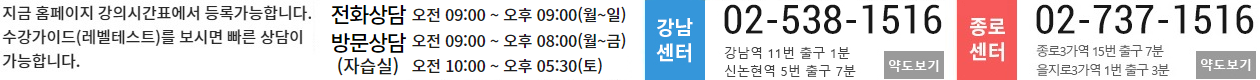лҜёкөӯ к°ңл°ң мҳҒм–ҙмқёмҰқмӢңн—ҳмқё нҶ н”Ң(TOEFL)кіј нҶ мқө(TOEIC)мқ„ 비лЎҜн•ң н•ҙмҷёк°ңл°ң мӢңн—ҳмқҙ көӯлӮҙ м „мІҙ мҳҒм–ҙмқёмҰқмӢңн—ҳм—җм„ң м°Ём§Җн•ҳлҠ” 비мӨ‘мқҙ 75% м •лҸ„мқё кІғмңјлЎң мҳҒм–ҙкөҗмңЎкі„лҠ” ліҙкі мһҲлӢӨ. лҜёкөӯмқҳ ETS(Educational Testing Service)мқҳ вҖҳлҢҖн‘ңмғҒн’ҲвҖҷмқё мқҙ мӢңн—ҳл“Ө л§җкі лҸ„ лҜёкөӯ мғҢл””м—җмқҙкі мЈјлҰҪлҢҖмқҳ м§Җ-н…”н”„(G-TELP), мҳҒкөӯ мә лёҢлҰ¬м§ҖлҢҖмқҳ м•„мқҙм—ҳмё (IELTS) л“ұмқҙ н•ңкөӯм—җм„ң мӢңн–үлҗҳлҠ” 비мӨ‘ мһҲлҠ” н•ҙмҷёк°ңл°ңмӢңн—ҳмқёлҚ° мқҙ мӨ‘ нҶ н”Ңкіј нҶ мқөмқҳ 비мӨ‘мқҙ м ҲлҢҖм ҒмқҙлӢӨ. 2л°ұ40л§ҢлӘ… к°Җлҹүмқҙ мҷёкөӯмӮ° мӢңн—ҳмқ„ м№ҳлҘҙкі мһҲлҠ” кІғмқҙлӢӨ.??2007л…„ н•ңн•ҙ н•ңкөӯмқҳ нҶ н”Ң мқ‘мӢңмһҗ мҲҳлҠ” 12л§Ң4мІңм—¬лӘ…мқҙлӢӨ. нҶ н”Ң мқ‘мӢңлЈҢлҠ” 170лӢ¬лҹ¬, мөңк·ј мӢңмһ‘н•ң м„ұм Ғмҡ°мҲҳмһҗмқёмҰқм„ң л°ңкёү비лҠ” 추к°ҖлЎң 40лӢ¬лҹ¬лӢӨ. нҷҳмңЁм—җ л”°лқј лӢӨлҘҙм§Җл§Ң 30л§Ңмӣҗ к°Җк№Ңмҡҙ лҸҲмқҙлӢӨ. 2л°ұл§ҢлӘ… мқҙмғҒмқҙ ліҙлҠ” нҶ мқө мқ‘мӢңлЈҢлҠ” 3л§Ң9мІңмӣҗ. мўӢмқҖ м җмҲҳлҘј кё°лҢҖн•ҳл©° м—¬лҹ¬ лІҲ мӢңн—ҳмқ„ м№ҳлҘҙлҠ” мқҙлҸ„ л§Һм•„ мҳҒм–ҙмқёмҰқмӢңн—ҳкіј мқҙлҘј лҢҖ비н•ң н•ҷмӣҗ мҲҳк°•лЈҢ, мұ…к°’ л“ұ лҢҖн•ҷмғқл“Өмқҳ л¶ҖлӢҙмқҙ нҒ° кІғмңјлЎң мЎ°мӮ¬(1мқёлӢ№ мҳҒм–ҙ кҙҖл Ё 비мҡ© 65л§Ңмӣҗ, 2008л…„ м„ңмҡёYMCA)лҗҳкё°лҸ„ н–ҲлӢӨ. кіөмӢқ нҶөкі„лҠ” м—Ҷм§Җл§Ң, мҷёкөӯмӮ° мқҙ л‘җ мӢңн—ҳм—җл§Ң н•ңн•ҙ м•„л¬ҙлҰ¬ м ҒкІҢ мһЎм•„лҸ„ 1мІңм–өмӣҗ мқҙмғҒмқҙ лӮҳк°ҖлҠ” кІғмңјлЎң 추мӮ°н• мҲҳ мһҲлӢӨ.
м„ңмҡёлҢҖк°Җ к°ңл°ңн•ң мӢңн—ҳ н…қмҠӨ(TEPS)лҘј мӢңмһ‘мңјлЎң көӯлӮҙк°ңл°ң мҳҒм–ҙмқёмҰқмӢңн—ҳ мӢңлҢҖк°Җ л¬ёмқ„ м—° м§ҖлҠ” 10м—¬л…„. к·ёлҸҷм•Ҳ нҶ м…Җ(TOSEL көӯм ңнҶ м…Җмң„мӣҗнҡҢ к°ңл°ң) н”Ңл үмҠӨ(FLEX н•ңкөӯмҷёлҢҖ) л©”мқҙнҠё(MATE мҲҷлӘ…м—¬лҢҖ) нҺ нҠё(PELT н•ңкөӯмҷёкөӯм–ҙнҸүк°Җмӣҗ) мқҙм—җмҠӨн”јнӢ°(ESPT к°•лӮЁлҢҖ) н…ҢмҠ¬(TESL н•ңкөӯнҸүмғқкөҗмңЎнҸүк°Җмӣҗ) н…ҢнҸ¬(TEFOW н…ҢнҸ¬м—°кө¬мӣҗ) л“ұ 8к°ң мӢңн—ҳмқҙ мҳҒм–ҙмқёмҰқмӢңн—ҳ мӢңмһҘм—җ 진м¶ңн•ҙ к°Ғ축мқ„ лІҢмқҙкі мһҲлӢӨ. мқҙ 분야м—җм„ңлҠ” мқҙ мӢңн—ҳл“Өмқ„ вҖҳнҶ мў…мҳҒм–ҙмқёмҰқмӢңн—ҳвҖҷмқҙлқј л¶ҖлҘёлӢӨ. мқ‘мӢңлЈҢлҠ” 2л§Ң~3л§Ң5мІңмӣҗ м •лҸ„лӢӨ.?мқҙ мӢңн—ҳл“Ө мӨ‘ н…қмҠӨлҠ” лӮҳлҰ„лҢҖлЎң м„ м „, нҷҖлЎңм„ңкё°мқҳ мҲҳмӨҖмқ„ нӣЁм”¬ мғҒнҡҢн•ң кІғмңјлЎң нҸүк°Җлҗҳкі мһҲлӢӨ. нҶ м…ҖмқҖ мЈјкҙҖмӮ¬мқё көҗмңЎл°©мҶЎ(EBS)мқҳ нӣ„кҙ‘кіј к°ңл°ңмһҗмқҳ м§ҖлӘ…лҸ„м—җ нһҳмһ…м–ҙ, лҳҗ н”Ңл үмҠӨ л©”мқҙнҠё мқҙм—җмҠӨн”јнӢ° л“ұмқҖ к°ңл°ң лҢҖн•ҷмқҳ нһҳмқ„ л“ұм—җ м—…лҠ” л“ұмңјлЎң мӢңмһҘ к°ңмІҷм—җ м Ғк·№ лӮҳм„ңкі мһҲлӢӨ. нҶ м…Җкіј нҺ нҠёлҠ” мҙҲмӨ‘л“ұн•ҷмғқл“Өмқҙ л§Һмқҙ ліҙлҠ” мӢңн—ҳмңјлЎң м •нҸүмқ„ м–»кі мһҲкё°лҸ„ н•ҳлӢӨ.

нҶ мў… мӢңн—ҳл“Ө мӨ‘ мқјл¶ҖлҠ” мқ‘мӢңмһҗмҷҖ н•ҷл¶ҖлӘЁ, көҗмӮ¬ л“ұ вҖҳмӢңмһҘвҖҷмқҳ мўӢмқҖ л°ҳмқ‘кіј н•Ёк»ҳ мҳҒм–ҙкөҗмңЎкі„лЎңл¶Җн„°лҸ„ мғҒлӢ№н•ң нҸүк°ҖлҘј л°ӣкі мһҲлӢӨ. мқјм • мҲҳмӨҖ нҶ н”Ң нҶ мқөмқҳ лҢҖм•ҲмңјлЎң нҷңмҡ©н• мҲҳ мһҲлӢӨлҠ” кІғмқҙлӢӨ. мӨ‘кі көҗмҷҖ лҢҖн•ҷ, кё°м—…мІҙл“Өмқҙ мқҙл“Ө нҶ мў…мӢңн—ҳмқ„ нҶ н”Ң нҶ мқөкіј н•Ёк»ҳ м „нҳ• кё°мӨҖмңјлЎң мӮјкі мһҲмңјл©°, н…қмҠӨмҷҖ нҶ м…Җ л“ұмқҖ н•ңкөӯм—җм„ңмқҳ кІҪн—ҳкіј нҸүнҢҗмқ„ нҶ лҢҖлЎң м•„мӢңм•„ көӯк°Җм—җ 진м¶ңн•ҳкё° мң„н•ң мӢңлҸ„лҘј н•ҳкі мһҲлҠ” кІғмңјлЎң м•Ңл ӨмЎҢлӢӨ. вҖңн•ңкөӯ мҳҒм–ҙкөҗмңЎ 1л°ұл…„мқҳ м „нҶөкіј кІҪн—ҳмқҳ кІ°мӢӨмқёлҚ°лӢӨ нҶ н”Ң нҶ мқө м•„лӢҲл©ҙ л°ңл¶ҷмқј м—„л‘җмЎ°м°Ё лӘ» лӮҙлҠ” 분мң„кё°м—җм„ң мӮҙм•„лӮЁмқҖ мӢңн—ҳмқҙм–ҙм„ң мҷёкөӯм„ңлҸ„ кІҪмҹҒл Ҙмқ„ к°Җм§Ҳ мҲҳ мһҲмқ„ кІғвҖқмқҙлқјкі н•ң кҙҖкі„мһҗлҠ” м„ӨлӘ…н–ҲлӢӨ.
мқҙлҹ° л…ёл Ҙм—җлҸ„ л¶Ҳкө¬н•ҳкі көӯлӮҙм—җм„ң к°ңл°ңлҗң мҶҢмң„ нҶ мў…мӢңн—ҳмқҳ мҡ°лҰ¬лӮҳлқј мӢңмһҘм җмң мңЁмқҖ 25% лӮЁм§“м—җ л¶Ҳкіјн•ҳлӢӨ. мқјліёмқҖ 60%, мӨ‘көӯмқҖ 95%, лҢҖл§ҢмқҖ 75% м •лҸ„лЎң мҡ°лҰ¬лӮҳлқјмҷҖ нҢҗмқҙн•ҳлӢӨ. кҙҖкі„мһҗл“Өкіј нҶ мў…мӢңн—ҳкё°кҙҖл“ӨмқҖ мҡ°лҰ¬ м „л¬ёк°Җл“Өмқҙ м¶ңм ңн•ҙ мҡ°лҰ¬ мӢӨм •м—җ л§һкі , мҷёкөӯм—җ лЎңм—ҙнӢ°лҘј м „нҳҖ лӮҙм§Җ м•ҠлҠ” көӯлӮҙк°ңл°ңмӢңн—ҳмқҙ мҷң мӢңмһҘм—җм„ң н•ҙмҷёк°ңл°ңмӢңн—ҳм—җ л§Ҙмқ„ лӘ» 추лҠ”м§Җ м•ҲнғҖк№ҢмӣҢн•ңлӢӨ.?мҳӨлһҳ мӢңмһҘмқ„ лҸ…м җн•ҙмҳӨлӢӨмӢңн”ј н•ң лҜёкөӯ ETSмқҳ вҖҳнҶ н”Ң нҶ мқө м•„м„ұ(зүҷеҹҺ)вҖҷмқҙ л„Ҳл¬ҙ нҒ¬лӢӨлҠ” м җмқҙ мҡ°м„ к·ё мқҙмң лЎң м§Җм ҒлҗңлӢӨ. н•ң кҙҖкі„мһҗлҠ” мҳҒм–ҙмқёмҰқмӢңн—ҳмқ„ н•„мҡ”лЎң н•ҳлҠ” н•ҷкөҗ кё°м—… кё°кҙҖ л“ұ мҲҳмҡ”кё°кҙҖмқҳ нҶ н”Ң нҶ мқөм—җ лҢҖн•ң л¬ҙмЎ°кұҙм Ғмқё мқҳмЎҙмқ„ л¬ём ң мӮјм•ҳлӢӨ. көімқҙ н•ҙмҷёк°ңл°ңмӢңн—ҳмқҙ м•„лӢҲм–ҙлҸ„ лҗ мғҒнҷ©мһ„м—җлҸ„ л¬ҙмЎ°кұҙ нҶ н”Ң нҶ мқө м җмҲҳмқ„ мҡ”кө¬н•ңлӢӨлҠ” кІғ. мөңк·ј мўҖ лӢ¬лқјм§Җкі лҠ” мһҲм§Җл§Ң, нҶ мў…мӢңн—ҳмқ„ м „нҳ•(йҠ“иЎЎ)мқҳ кё°мӨҖмңјлЎң мӮјмңјл©ҙ мһҗкё° кё°кҙҖмқҳ к¶Ңмң„к°Җ л–Ём–ҙм§ҖлҠ” кІғмңјлЎң м—¬кё°лҠ” 분мң„кё°лҸ„ мһҲлӢӨлҠ” кІғмқҙлӢӨ.
нҶ н”ҢмқҖ лҜёкөӯм—җ мң н•ҷн•ҳл ӨлҠ” м„ёкі„ м—¬лҹ¬ лӮҳлқјмқҳ н•ҷмғқл“Өмқҙ лҢҖн•ҷм—җ к·ё м җмҲҳлҘј м ңм¶ңн•ҙм•ј н•ҳлҠ” мӢңн—ҳмқҙлӢӨ. вҖҳмўӢмқҖ мӢңн—ҳвҖҷмқҙкё°лҠ” н•ҳм§Җл§Ң, лҜёкөӯмң н•ҷкіј кҙҖкі„м—ҶлҠ” мҡ°лҰ¬лӮҳлқјмқҳ н•ҷкөҗлӮҳ кё°м—… л“ұмқҙ м—„мІӯлӮҳкІҢ 비мӢј мқ‘мӢңлЈҢмҷҖ л¶ҲнҺёлҘј л¶ҖлӢҙн•ҙм•ј н•ҳлҠ” мқҙ мӢңн—ҳмқҳ м җмҲҳлҘј мҷң көімқҙ мҡ”кө¬н•ҳлҠҗлғҗ н•ҳлҠ” ліјл©ҳмҶҢлҰ¬лҠ” лҒҠмһ„м—Ҷмқҙ м ңкё°лҗңлӢӨ. н•ңкөӯ мқ‘мӢңмһҗк°Җ л„Ҳл¬ҙ л§Һм•„ мқҙлҘј л¬јлҰ¬м ҒмңјлЎң мҲҳмҡ©н•ҳм§Җ лӘ»н•ҳлҠ”лҚ°м„ң мғқкё°лҠ” л¶ҲнҺёкіј л¶Ҳл§ҢлҸ„ м Ғм§Җ м•ҠлӢӨ. н•ңл•ҢлҠ” л§ҺмқҖ мқ‘мӢңмһҗк°Җ мқҙ мӢңн—ҳмқ„ ліҙкё° мң„н•ҙ мқјліёмӣҗм •м—җ лӮҳм„ңм•ј н•ҳкё°лҸ„ н–ҲлӢӨ.?нҶ мқөмқҖ мқјліё лҢҖмһҘм„ұмқҳ мқҳлў°лЎң лҜёкөӯмқҳ ETSк°Җ л§Ңл“ л№„мҰҲлӢҲмҠӨ мҳҒм–ҙ мӢңн—ҳмқҙлӢӨ. мҡ°лҰ¬лӮҳлқјм—җм„ңлҠ” кё°м—…л“Өмқҙ л§Һмқҙ мұ„нғқн•ҳкі мһҲм–ҙ м •мһ‘ мқҙ мӢңн—ҳ к°ңл°ңмқҳ лӢ№мӮ¬көӯ мӨ‘ н•ҳлӮҳмқё мқјліёліҙлӢӨ мқ‘мӢңмһҗк°Җ лҚ” л§ҺлӢӨ. мЈјлЎң н•ңкөӯкіј мқјліёмӮ¬лһҢл“Өмқҙ ліҙлҠ”лҚ° л§үмғҒ лҜёкөӯм—җм„ңлҠ” мқҙ мӢңн—ҳмқҳ мЎҙмһ¬м—җ лҢҖн•ҙ м•„лҠ” мӮ¬лһҢмқҙ лі„лЎң м—Ҷкі , мқҙ мӢңн—ҳ м җмҲҳлҘј нҷңмҡ©н• мҲҳ мһҲлҠ” кІҪмҡ°лҸ„ кұ°мқҳ м—ҶлӢӨ. мқ‘мӢңлЈҢ мӨ‘ мғҒлӢ№ л¶Җ분мқҙ лЎңм—ҙнӢ°лЎң лҜёкөӯкіј мқјліёмңјлЎң нқҳлҹ¬ лӮҳк°„лӢӨ.

кІ°кіјм ҒмңјлЎң лҜёкөӯ ETSмқҳ кі к°қ көӯк°Җ мӨ‘ н•ңкөӯмқҙ к°ҖмһҘ мӨ‘мҡ”н•ң мҲҳмһ…мӣҗмқј кІғмңјлЎң кҙҖкі„мһҗл“ӨмқҖ 추측н•ңлӢӨ. н•ңкөӯмқҙ ETSлҘј лЁ№м—¬ мӮҙлҰ°лӢӨлҠ” л§җлҸ„ мһҲлӢӨ. мқҙл ҮкІҢ мӨ‘мҡ”н•ң кі к°қмқё н•ңкөӯмқҳ нҶ н”Ң мқ‘мӢңмһҗл“Өмқҙ н•©лӢ№н•ң лҢҖм ‘мқ„ л°ӣм§Җ лӘ»н•ҳкі мһҲлӢӨлҠ” м§Җм ҒлҸ„ лҒҠмқҙм§Җ м•ҠлҠ”лӢӨ. мқ‘мӢңмһҗ к·ңлӘЁм—җ л§һлҠ” мқён„°л„· кё°л°ҳмқ„ нҷ•ліҙн•ҳм§Җ м•Ҡм•„ мӢңн—ҳ мӨ‘ м ‘мҶҚмһҘм• к°Җ л°ңмғқн•ҳлҠ” л“ұмқҳ вҖҳмһҰмқҖ мӮ¬кі вҖҷлҸ„ к·ёлҹ° м§Җм Ғ мӨ‘ н•ҳлӮҳлӢӨ. ETSлҠ” лҜёкөӯ лҢҖн•ҷкіј лҢҖн•ҷмӣҗмқҳ мҷёкөӯн•ҷмғқ м „нҳ•мқ„ мң„н•ң к°Ғмў… мҳҒм–ҙмӢңн—ҳмқ„ м—°кө¬ к°ңл°ңн•ҳлҠ” лҜјк°„кё°кө¬лӢӨ.
мқјліём—җлҠ” 1963л…„л¶Җн„° мӢңн–үлҗң мҳҒм–ҙлҠҘл ҘкІҖм •нҳ‘нҡҢ(STEP)мқҳ мҳҒм–ҙмқёмҰқмӢңн—ҳ м—җмқҙмј„(EIKEN)мқҙ көӯк°Җм Ғмқё м§Җмӣҗмқ„ л°ӣмңјл©° лҝҢлҰ¬ лӮҙлҰ° м§Җ мҳӨлһҳлӢӨ. мқјліё лӮҙм—җм„ңлҸ„ к·ёл Үм§Җл§Ң н•ҙмҷём—җм„ңлҸ„ мқјліё мң н•ҷмғқмқ„ мң м№ҳн•ҳкё° мң„н•ҙ мқҙ мӢңн—ҳмқ„ мқём •н•ҳлҠ” н•ҷкөҗк°Җ 6л°ұк°ң мқҙмғҒмқҙлӢӨ. нҶ н”Ң м•Ҳ лҙҗлҸ„ мҷёкөӯмң н•ҷмқҙ м–ҙлҠҗ м •лҸ„ к°ҖлҠҘн•ң кІғмқҙлӢӨ. мӨ‘көӯмқҖ 1987л…„л¶Җн„° м •л¶Җк°Җ м§Ғм ‘ лҢҖн•ҷмғқмҡ© мҳҒм–ҙмқёмҰқмӢңн—ҳмқё м”ЁмқҙнӢ°(CET)лҘј мҡҙмҳҒн•ҳлҠ”лҚ°, н•ҷмӮ¬н•ҷмң„ м·Ёл“қ мҡ”кұҙмңјлЎң нҷңмҡ©лҗҳкё° л•Ңл¬ём—җ н•„мҲҳм Ғмқҙл©° мӨ‘көӯ진м¶ң мҷёкөӯкё°м—… л“ұлҸ„ мқҙлҘј м Ғк·№ нҷңмҡ©н•ңлӢӨкі н•ңлӢӨ. мһҗкөӯмӢңн—ҳмқҙ н•ҙмҷёмӢңн—ҳмқ„ м••лҸ„н•ҳкі мһҲлҠ” кІғмқҙлӢӨ.?н…қмҠӨ нҶ м…Җ н”Ңл үмҠӨ л“ұ нҶ мў…мӢңн—ҳл“Өмқҙ нҠјмӢӨн•ң л¬ён•ӯк°ңл°ңкіј ліҖлі„л Ҙ м—°кө¬ л“ұмңјлЎң м№ҳм—ҙн•ң кІҪмҹҒмқ„ лІҢмқҙкі мһҲкё° л•Ңл¬ём—җ м„ұмһҘмқҙ л№ лҘҙл©°, лЁём§Җм•Ҡм•„ мқјліёмқҙлӮҳ мӨ‘көӯмқҳ нҶ мў…мӢңн—ҳмқҙ к·ё лӮҳлқјм—җм„ң н•ҳкі мһҲлҠ” кІғліҙлӢӨ лҚ” мӨ‘мҡ”н•ң м—ӯн• мқ„ н•ҳкІҢ лҗ кІғмқҙлқјлҠ” кё°лҢҖлҸ„ мһҲлӢӨ. к·ёлҹ¬лӮҳ нҶ мў…мӢңн—ҳмқҳ л°ңм „мқ„ мң„н•ҙм„ңлҠ” мҲҳмҡ”кё°кҙҖкіј мҲҳмҡ”мһҗмқҳ мқёмӢқмқҳ ліҖнҷ”к°Җ м „м ңлҗҳм–ҙм•ј н•ңлӢӨкі н•ң мӢңн—ҳкё°кө¬мқҳ кҙҖкі„мһҗлҠ” л§җн–ҲлӢӨ.
кҙҖкі„мһҗлӮҳ м „л¬ёк°Җлҝҗл§Ң м•„лӢҲлқј н•ҷл¶ҖлӘЁк№Ңм§ҖлҸ„ мҳҒм–ҙмӢңн—ҳмқҙлқјл©ҙ мңјл Ҳ нҶ н”Ң нҶ мқөл¶Җн„° м—°мғҒн•ҳлҠ” кҙҖн–үм—җм„ң лІ—м–ҙлӮҳм•ј н•ңлӢӨлҠ” кІғмқҙлӢӨ. нҠ№мҲҳлӘ©м Ғкі мқё Sкі л“ұмқҳ кІҪмҡ° н•ҷмғқл“Өм—җкІҢ н•ңн•ҙ 3нҡҢ мқҙмғҒ нҶ н”ҢмқҙлӮҳ нҶ мқө мӢңн—ҳмқ„ м№ҳлҘҙкІҢ н•ҳлҠ” кІғмңјлЎң м•Ңл ӨмЎҢлӢӨ. мһ¬лІҢкё°м—… кіөкё°м—… л“ұмқҳ нҶ н”Ң нҶ мқө вҖҳм§қмӮ¬лһ‘вҖҷлҸ„ лҸ„лҘј л„ҳлҠ”лӢӨ. к°Ғмў… м •л¶ҖмЈјлҸ„ мһҗкІ©мӢңн—ҳлҸ„ нҶ н”Ңкіј нҶ мқө м җмҲҳлҘј мҡ”кө¬н•ңлӢӨ. лӢӨн–үнһҲ мөңк·ј л“Өм–ҙ н…қмҠӨмҷҖ нҶ м…Җ м •лҸ„лҘј лҒјмӣҢ л„ЈлҠ” кІҪмҡ°к°Җ мһҗмЈј ліҙмқҙкё°лҠ” н•ңлӢӨ.?мқҙлҜё м „к°ңлҗҳкі мһҲлҠ” нҶ мў…мӢңн—ҳмқҳ мӢӨмғҒмқ„ нҢҢм•…н•ҳкі к°Ғ мЎ°м§Ғмқҳ н•„мҡ”м—җ л§һлҠ” мӢңн—ҳм—җ кҙҖмӢ¬мқ„ к°Җ진лӢӨл©ҙ мҳҒм–ҙмқёмҰқмӢңн—ҳ мӢңмһҘмқҳ мҷңкіЎ нҳ„мғҒмқҙ мғҒлӢ№ л¶Җ분 н•ҙмҶҢлҗ кІғмңјлЎң кҙҖкі„мһҗл“ӨмқҖ м „л§қн•ңлӢӨ. мқҙлҜё м •нҸү мһҲлҠ” лӘҮлӘҮ мӢңн—ҳ к°„мқҳ м җмҲҳ нҷҳмӮ°мқҙ к°ҖлҠҘн•ң мғҒкҙҖн‘ңк°Җ л§Ңл“Өм–ҙм ё нҷңмҡ©лҗҳкі мһҲм–ҙ нҶ мў…мӢңн—ҳмқҳ 추к°Җ мұ„нғқм—җ л”°лҘё кё°мҲ м Ғ л¬ём ңлҸ„ м ңкұ°лҗң мғҒнҷ©мқҙлқјлҠ” кІғмқҙлӢӨ. нҶ н”Ң нҶ мқөмқ„ м§ҖкёҲмІҳлҹј мұ„нғқн•ҳлҚ”лқјлҸ„, н…қмҠӨ нҶ м…Җ н”Ңл үмҠӨ л“ұ мҡ°лҰ¬ мӢңн—ҳлҸ„ м „нҳ•лҸ„кө¬м—җ нҸ¬н•ЁмӢңмјң мқ‘мӢңмһҗ м„ нғқмқҳ нҸӯмқ„ л„“нҳҖ мӨ„ мҲҳ мһҲлӢӨлҠ” л°©м•ҲмқҙлӢӨ.
м •кі„м—җм„ңлҸ„ мқҙ л¬ём ңмқҳ л…јмқҳк°Җ кө¬мІҙнҷ”лҗ м „л§қмқҙлӢӨ. мӢ¬мһ¬мІ н•ңлӮҳлқјлӢ№ мқҳмӣҗмқҖ мөңк·ј кҙҖл Ё нҶ лЎ нҡҢлҘј м—ҙкі вҖңмқјліёкіј мӨ‘көӯмқҖ көӯк°Җ мЈјлҸ„лЎң м„ұкіөм ҒмңјлЎң мҳҒм–ҙмқёмҰқмӢңн—ҳмқ„ к°ңл°ң мӢңн–үн•ҙмҳӨкі мһҲм–ҙ мҳҒм–ҙкөҗмңЎ л¶Җл¬ём—җ нҷҳлҘҳ(йӮ„жөҒ)нҡЁкіјлҘј лӮҙкі мһҲмңјлӮҳ мҡ°лҰ¬лҠ” м•„м§Ғ нҶ н”Ңкіј нҶ мқөм—җл§Ң л§ӨлӢ¬л Ө мһҲм–ҙ л¬ём ңвҖқлқјкі м •л¶Җм—җ к°ңм„ мқ„ мҙүкө¬н–ҲлӢӨ.?көҗкіјл¶Җ 추진 көӯк°ҖмҳҒм–ҙлҠҘл ҘмӢңн—ҳмқҖ нҳ„мһ¬ л¬ён•ӯк°ңл°ң мһ‘м—…мқ„ 진н–үн•ҳкі мһҲлҠ”лҚ° мһ…мӢңмҡ©лҸ„ мҷём—җлҸ„ мӨ‘мһҘкё°м ҒмңјлЎң нҶ мқө лҢҖмІҙлҘј лӘ©н‘ңлЎң н•ҳлҠ” кІғмңјлЎң м•Ңл Өм§Җкі мһҲлӢӨ. лҠҰкІҢлӮҳл§Ҳ мҳҒм–ҙкөҗмңЎнҸүк°Җл¶Җл¬ё мЈјк¶ҢнҡҢліөмқҳ мІ« кұёмқҢмқ„ л–јкі мһҲлҠ” мғҒнҷ©л“ӨлЎң нҢҢм•…н• мҲҳ мһҲлӢӨ.